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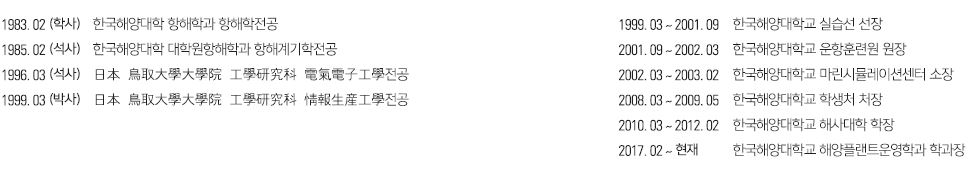
바다와 처음 만나게 된 것은
_충청도, 그러니까 내륙지방이 고향이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우리대학을 오게 된 것은 아니다. 바다에 대한 동경은 어느 정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집안 사정 때문이었다. 우리대학이 기관공학과와 항해학과만으로 이루어져 있던 시절, 우리에게는 숙식 제공과 등록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승선실습을 하고, 후에 바다에서 항해사로 일하면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취직을 목표로 우리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더러 있었다. 단체생활과 고된 훈련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내게 늘 바다는 새로운 존재였다. 언제 어디서나 아름다운 모습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취직을 위해 오게 되었지만 40 여년 가까이 우리대학에 있게 된 것은 그 순간 덕분이 아니었나 싶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_학교를 졸업하고 조교와 승선생활을 거친 후 1991년도에 처음으로 강단에 섰다. 지금도 그렇지만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때 나름대로 열심히 일에 임했던 기억이 난다. 다만 언제나 역경은 존재했다. 교수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 우리대학에서 꽤 큰 시위가 일어난 적이 있다. 90년대 당시 해사대 학생은 모두 학생군사교육단(이하 ROTC)이 되어야 했다. 만약 중간에 ROTC를 그만두게 되면 학교 측으로부터 제적을 당했다. 그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강한 규율과 억압에 억눌려 있던 학생들의 불만이 터지게 된 것이다. 우리대학이 ‘자유화’라는 변화에 발맞추지 못한 점도 있었지만 교수와 학생들 간의 제대로 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역시 문제이지 않았나 생각을 한다. 이 날을 계기로 ‘학생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 같다.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
_매주 목요일마다 오후 시간을 비워둔다. 학생들과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다. 2010년 대까지만 해도 졸업논문을 쓰는 4학년 외에는 학생들과 교수 간의 교류가 별로 없었다. 그를 위해 나는 2012년 2학기부터 ‘LNTP‘ 라는 팀을 만들어 학생들과 만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만들었다. 학생들의 사정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고, 강의 중에는 못 다한 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 있는 시간이다. 또한 가끔 졸업한 학생들이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하고 갈 때는 역시 교수를 해서 잘했다는 생각도 든다. 이것이 교수들의 가장 큰 보람은 아닐까.
_가르치는 일이 적성에 맞는 것도 같다. 강단에 처음 섰을 때와 지금과 다른 것이 있다면 숙련도 정도다. 강한 열정은 그대로다. 그러나 지금의 나에게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있다.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방향으로 강의를 하다보면 가르쳐야 할 분량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다. 30여 년을 교수직에 몸 담그고 있지만 아직도 나를 고민하게 하는 문제다. 교수가 꼭 이루어야 할 과업이라고도 느껴진다.
나를 뛰게 하는 원동력
_사람이 늘 열정적일 수만은 없다. 해야 할 것도 많고, 신경써야할 것도 많으니까.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나는 달리기를 택했다. 평소 등산이나 산책은 자주 했던 편이지만 마라톤을 시작하게 된 건 꽤 특별한 계기였다. 2008년, 부산일보에서 주최하는 마라톤에 우리대학 학생들과 참가한 적이 있다. 우리대학 학생들 약 200여명과 함께 티셔츠를 맞춰 입고 달렸던 추억이 즐거운 기억으로 남았는지 그때부터 마라톤을 취미로 갖게 되었다. 달릴 때는 아무 생각 할 필요가 없다. 몸이 힘들기 때문에 달리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다. 긴 마라톤을 끝낸 후 밀려오는 뿌듯함과 후련함은 덤이다.
힘든 시기인 것을 알고 있지만
_우리 모두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청년 실업률도 높고 많은 학생들이 힘든 처지에 놓여있다. 다들 각자의 사정을 안고 있겠지만, 내가 우리대학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 열심히 임하라‘다. 자신만의 비전은 놓지 않되, 너무 고민하지 말기. 이로써 모두가 자신의 뜻을 묵묵히 일궈낼 수 있으면 좋겠다.


